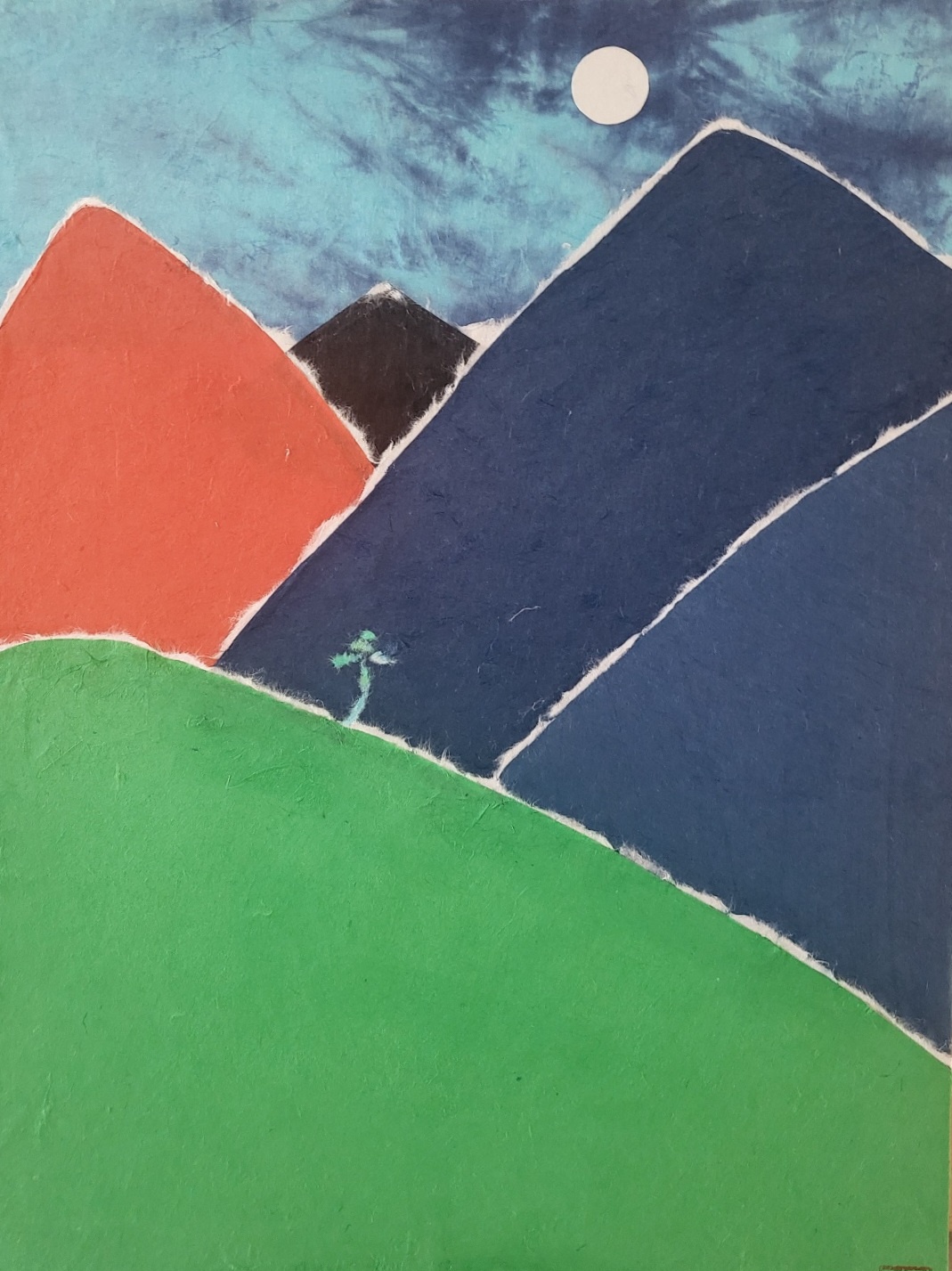"심장은 인간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생명과 마음의 중심인 심장의 비유적ㆍ은유적 의미에 대한 논의"
이성근 영남대 명예교수ㆍ행정학박사
심장은 생명과 마음의 중심이다
심장은 육체의 기관이자, 인간 존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생물학적으로는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하지만, 철학적으로는 마음, 감정, 의지, 윤리의 집약적 상징으로 작용해왔다. 문화권을 막론하고 우리는 용기를 낼 때 “심장을 부여잡는다”고 하고, 진심 어린 말을 “가슴에서 우러났다”고 표현한다. 실제로 ‘심장’은 ‘마음’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며, 감정과 도덕, 신념과 정서를 아우르는 메타포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심장’이라는 개념을 다섯 가지 키워드로 나누어 고찰한다. 각 주제마다 성경 말씀, 고사성어, 명언, 속담 등을 곁들여 삶의 방향성과 교훈을 제시한다.
심장은 내면의 용기를 상징한다: 일심불란(一心不亂)과 두려움의 초월
심장은 두려움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가장 먼저 반응하는 기관이다. 공포를 이겨내고 결단을 내릴 때 사람은 머리보다 먼저 ‘가슴’을 다잡는다. “저 사람은 강심장이야”, “심지가 굳어”라는 말은 이 내면의 용기를 가리킨다.
고사성어 일심불란(一心不亂)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뜻하며, 위기 앞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는 태도를 강조한다. 성경 "여호수아" 1장 9절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며, 심장의 결단과 신념이 신앙과 연결될 때 더욱 강력해짐을 보여준다. 넬슨 만델라도 “용기란 공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이겨내는 것이다”라며 심장의 용기를 기렸다.
심장은 공감의 발원지다: 마음의 소통과 진심(眞心)의 상징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필이 간다”, “필이 통한다”는 표현이 유행한다. 진정한 공감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며, 마음과 마음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
우리가 말하는 ‘따뜻한 심장’은 타인을 향한 연민과 이해에서 비롯된다. “마음에서 우러난 말은 마음을 울린다”는 속담처럼, 진심은 심장의 떨림에서 시작된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하여 사랑과 공감이 인간 존재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마더 테레사는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공감은 진심의 가장 따뜻한 실천이다.
심장은 정직과 양심의 상징이자 삶의 기준이다
심장은 오랫동안 도덕적 판단의 중심지로 상징되어 왔다. “저 사람은 양심가다”, “양심을 팔았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는 말은 양심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있다는 문화적 인식을 보여준다.
공자의 가르침처럼, 마음(心)은 인간됨의 중심이다. 진정한 정직은 가슴에서 비롯된다. '양심을 팔지 마라'는 양심불가매(良心不可賣)는 양심은 팔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돈이나 권력보다 진실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칸트는 “양심은 우리 안의 법정이다”라고 했으며, 그 법정의 심판관은 머리가 아니라 바로 마음이다. 정직은 외부의 규율이 아닌 내면의 심장이 지켜내는 것이다.
심장은 인내의 상징이고 견딤의 미학이다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뛴다. 그 끊임없는 박동은 곧 인내의 상징이다. 삶의 고난은 가슴 깊이 침전되고, 그 시간을 견뎌낸
사람은 더욱 깊어진다.
“참을 인(忍)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속담은 인내가 얼마나 큰 자제를 요구하는지를 보여준다. 성경 "로마서" 5장 3~4절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한다. 고통은 심장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 심장을 통해 희망이 피어난다.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는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라고 말했는데, 그 빛과 사랑은 바로 인내하는 심장에서 솟아난다.
심장은 평안과 내면의 쉼이고 마음의 고요함이다
마음이 편안할 때 심장은 조용히 고동친다. 반대로 불안, 분노, 죄책감에 시달릴 때 심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친다. “심장이 아프다”, “억장이 무너진다”, “마음이 뻥 뚫린다”는 표현은 마음과 몸이 하나임을 보여준다.
한자성어 심경여수(心如流水)와 심여지수(心如止水)는 모두
마음이 고요하고 중심이 잡힌 상태를 뜻하며, 진정한 휴식과 내적 안정이 심장의 고요함에서 비롯됨을 상징한다. 성경 "빌립보서" 4장 7절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한다. 마음의 평온이 심장을 지키고, 심장의 평온이 삶을 지켜낸다. 소크라테스도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면의 질서에서 온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심장은 내면의 교향악이다
심장은 물리적 기관을 넘어, 감정과 도덕, 결단과 쉼의 상징으로 작용한다.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머리보다 가슴에 물어야 한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심장을 삶의 중심에 두라는 메시지이다.
심장은 조용히 말하지만, 그 언어는 결코 가볍지 않다. 용기와 공감, 정직과 인내, 그리고 평안이 깃든 그 울림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실한 삶의 길이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오맛과 오살의 노래 312 (0) | 2025.07.03 |
|---|---|
| 오미오살(五味五煞)은 다섯 맛을 살아낸 삶의 지혜이다 311 (0) | 2025.07.03 |
| 자신의 삶을 지키는 ‘거리두기’의 지혜: 물러서야 할 인간관계의 경계 314 (1) | 2025.06.30 |
| '돈이 말한다(Money Talks)'는 동서양 속담이 가진 함의 313 (1) | 2025.06.29 |
| 고은층의 사계절에 대한 단상: 일, 관계, 자산, 감정에 대하여 310 (1) | 2025.06.27 |